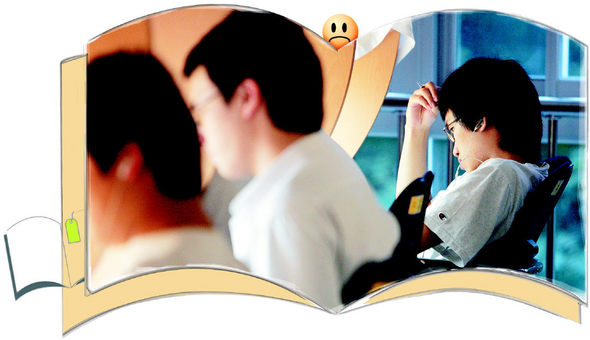|
‘원하는 길’보다 ‘가능한 길’ 나열…교실 현장 진학지도 구멍 못메워
“어느 대학 갈 거냐고 물어보지 말구요, 어느 학과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안돼요?” 08학년도 대입의 수시 2학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일 늦은 오후, 서울 ㅇ고등학교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말문을 트기 위해 지망 대학을 물었더니 학생들이 화제를 돌렸다.
‘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진학을 놓고 다들 고민이 깊어진다.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이 등급제로 바뀌고, 대학들이 다양한 입시전형을 내놓아 대학 가는 길이 더욱 복잡해진 08학년도 입시에서 충분한 진학정보를 얻어 입시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고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낫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만큼 학교 안이나 밖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는 ‘비상위권’ 수험생들은 진학 설계를 놓고 비빌 언덕을 찾기가 힘들다.
“선생님과 이제 곧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요.” 항공대를 지망하는 오아무개(18)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갈 수 있는 대학’만을 놓고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진학 상담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다. 대개는 ‘꿈’을 접어야 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시간이 돼야 할 시간이 ‘낙망’의 시간이 된다.
08학년도 대입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교육부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적성을 고려해 진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할 학부학과와 대학을 정해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학교에서 만난 내신 4~6등급의 중위권 학생들은 대개 3학년에 올라와서야 지망 학과와 대학을 정했다. 그들 스스로도 “늦었다”고 인정했다.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흥미나 적성보다는 결국 성적을 기준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 3학년이 돼서야 이뤄지는 교사의 진학지도는 ‘붙는다’ ‘떨어진다’ 정도에 그친다.
아이들은 스스로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진학도 고려하지만 부모의 반대와 사회의 편견 때문에 곧 마음을 접고 만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없으니 ‘마이너리그’를 택할 소신을 갖기도 어렵다.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내로라하는 입시 전문가들의 입시자료가 넘쳐 나지만 중하위권 대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찾기 힘들다. 입시요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공부하기에 바쁜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스스로를 책망할 뿐이다. “1학년 때 내신 관리 잘 하라고 했던 선생님 말씀 들을 걸 후회돼요.” 이렇게 ‘열공’하지 않은 고교 1, 2학년 시절을 후회한다. 새 입시제도의 실험대에 올려놓고 충실한 진학 지도가 없는 학교 안팎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만도 하지만, 아이들은 진학 지도의 대상이 될만한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기만 한다.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워낙에 복잡해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을 이해하고 있다.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하향지원 해야 하면 어쩔 수 없죠. 공부 안 한 제 탓인걸요.” 비빌 언덕 없는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고독하기만 하다.
대학보다는 소질을 실현할 수 있는 학부학과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원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진학 지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열해 주는 진학 지도만 있다. 그조차도 학교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광주 ㅇㅇ여고의 3학년입니다. 수시2차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쪽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잡는것이 훨씬 저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서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신 성적으로는 서울은 조금 부족하고 경기나 인천권은 안정적이라서 이곳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입시 경험이 부족합니다. 수능도 꼭 보려고 하는데, 수시에서 문어발 지원은 위험하다고 하고… 가장 유리한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지금까지 논술을 배워본 적이 없어 면접을 보는 곳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일반학과에 들어가 교직이수를 해서 교사가 되라고 하지만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교직이수가 되는지 고민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교육>에 장문의 진학 상담을 보낸 한 학생의 글이다. 아이들은 꿈이 있다. 그 꿈은 부모님의 희망까지 배려한 현실적인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거의 없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성적이 낮은’ 그 아이만의 문제인가? 교사의 ‘진학 지도’가 메꿔야 할 교육 현장의 공백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교육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理知논술/대입 컨설팅]수시 2학기 지원전략 세우기 (0) | 2007.09.10 |
|---|---|
| 새입시제도에 교사들 진학지도 ‘빨간불’ (0) | 2007.09.10 |
| 고교 우등생이 되기 위한 7가지 공부습관 (0) | 2007.09.10 |
| 수시 2학기 모집 시작…수험생 전략은 (0) | 2007.09.09 |
| YBM 전화영어 서비스 (0) | 2007.09.08 |